저번 주는 내내 불안했다.
몇가지 생활의 변화가 있긴 했는데 그게 이유는 아닌 거 같고 10일 코스 후유증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류의 불안은 내가 자주 느끼지 못하는 감정이기 때문에 흥미로운 경험이었지만 역시 대단히 불쾌했다.
아니면 항상 어느 언저리에 자리하고 있던 것이었는데 둔감함이 그걸 인지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었던 걸 수도 있고..
그러고 보니 급한 성질의 기저에 깔려있는 심리도 결국 불안이 아닌가? 빨리빨리 해야 돼 죽음이 다가오고 있잖아 같은 거 여하튼
뉴질랜드 비자 신청하던 때의 기억이 떠올랐다. 공무청에서 문제가 생겨서 워홀비자 신청한 사람들이 도시에 있는기관에 직접 찾아가 해결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깡촌 호스텔에서 차 타고 애들레이드까지 나가는데 인터뷰 시간을 착각했던가 아무튼 좀 후달리는 상황이었음
차 안에는 비자를 신청했던 나와 테자씨, 테자씨의 일본인 여친 그리고 기억 안 나는 한사람 그렇게 네 명이 있었음.
경상도 남자인 테자씨는 말수가 적고 chill한 타잎이었고 원래 서로 소 닭 보듯 하다가 이날 처음으로 교류를 해 봄
시간이 다가올수록 차 안에서 내가 agitating한 상태를 보였던 걸로 기억함
왜냐면 한국에 돌아가기 너무너무 싫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오 비자 취소되면 어떡하냐고 투덜대고 있으니까 말 없이 운전 중이던 테자씨가 갑자기 특유의 느릿느릿한 말투로
" 비자를 안 준다고 하면 뉴질랜드를 안 가면 되는거죠 "
딱 한마디 했는데 그때 뭔가 띵 하고 머리를 맞은 느낌이 있었음
말 때문만이 아니라 그 태도와 바이브에서 뭔가 전달되는게 있더라고.. 일종의 big dick energy같은 거
그니까 전전긍긍 한다고 안 나올 비자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거 못 받는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암튼 그래서 침착성을 되찾았고 관공서 도착해서 상황 설명도 잘 했고 비자도 무사히 얻어서 돌아왔다는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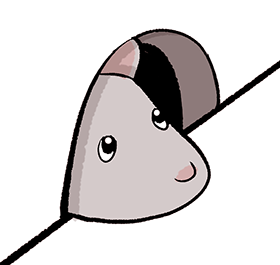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